우리는 왜 걸을까!
#1 걷기에 앞서

그러나 마을을 걷는 다는 것은 단순히 점에서 점으로의 이동이 아닌 내 몸의 온 감각을 사용하며 나를 둘러싼 세계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계를 만난 다는 것이 대단히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함께 사는 동물, 식물, 이웃, 내 안의 감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상했던 것이든 아니든, 나의 의지와 맞닿든 아니든 만나게 됩니다. 내가 걷는다는 것만으로 내 생에 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의미를 찾기 이전에 그냥 산책만 해도 ‘우선 멈춤‘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중. 프레데리크 그로)
손에서 떠나질 않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야 하고, 급히 정리해야할 문서를 만들던 컴퓨터도 놓고 나와야 합니다. 놀아주기만 바라는 반려동물과도 잠시 인사하고 나와야 하며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도 일단 쌓아 두기로 합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과감히(?) 놓고 나오면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바람의 향기가 달라지는 것, 작은 텃밭에 심겨진 쑥갓이 피운 노란 꽃, 갈지자로 뛰어 가는 하교하는 아이들, 계단을 오르다 잠시 쉬어가시는 할머니. 내가 사는 마을에 새삼스레 이런 풍경이 있었구나, 합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야 마음이 가고 아낌의 관계가 만들어 집니다. 그런 시선이 서로 오고가며 조응(교감)을 이루게 되며 마을이라는 공간자체가 ‘아우라’로 둘러싸입니다. 즉 장소성을 갖게 됩니다.
벤야민은 이 개념을 보들레르의 ‘교감’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보들레르는 이 시에서 “인간이 상징의 숲속을 지나면/ 상징의 숲은 정다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다” 고 쓰고 있습니다.
#2 도시를 걷는 다는 것
그러나 사실 우리가 걷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오롯이 몽상의 시간만을 가질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갖지 않고요. 그래서 걷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주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이 아니면 걷기란 피곤한 스포츠처럼만 느껴집니다. 실제로 도시는 ‘걷는 사람’ 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에게 더욱 친절한 공간입니다. 차가 달리는 도로 옆을 걷는 것은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소음에, 매연에 그리고 중간 중간 나를 방해하는 입간판, 볼라드(보도로 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설치물), 신호등.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덩어리만 보고 걷기가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을에서 걷기를 시도합니다. 그 것이 우리가 도시에서 마땅히 누려야할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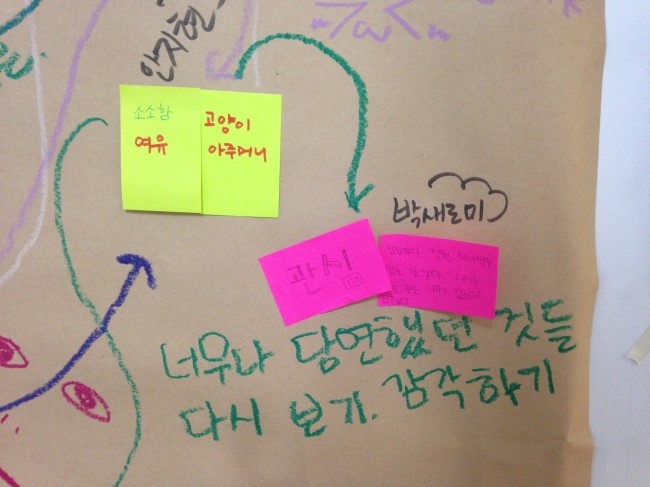
공간이론에서는 보행이 자유로운 공간일수록 민주적인 공간으로 봅니다. 그 자유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든 가능해야하며 서로 섞여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여의도공원을 군사퍼레이드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며 가치공유를 강요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다양한 행위를 하며 ‘공존’ 하며 절대적 진리는 배제된 “소진되지 않는 담론의 풍부함”이 있는 공간이 민주적 공간입니다.(사이토 준이치)
따라서 자유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권리로서 걷기를 하는 것은 소소하지만 위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간디가 1930년대 대영제국에 맞선 비협력운동을 하며 사티아그라하 즉 소금행진을 했던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현재 집회현장에서도 사람들이 도시공간을 점유하고 행진하는 것 또한 굉장히 큰 힘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 현장에서 뜻을 함께 동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연스레 서로 섞이며 팽팽히 긴장상태를 만들기도, 느슨하게 풀어진 상태를 만들기도 하는 흐름자체가 건강하고 민주적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많이 걸어야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