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 1
“내가? 무슨 소리야!”
낙서한 놈이 내는 소리였다.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도서관 직원에게 반납하거나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는 방법이다. 나는 내가 반납 처리한 책은 책장을 휘리릭 넘기면서 상태가 깨끗한지 확인한다. 내가 이용자일 때,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다가 누군가가 밑줄과 끄적끄적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책인 것 마냥 표시를 해둔 것이 언짢았고, 책 내용보다 그 낙서에 시선이 가며 인상이 찌푸려졌었다. 다른 이용자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반납받은 책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전공 책을 반납받았다. 전공 책에는 밑줄이 쳐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도 역시나였다. 다행히 연필로 쓰여 있었다. 날짜도 적혀있었는데, 연도, 월, 일이 다 적혀있었다. 날짜는 누가 낙서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 낙서이다. KORAS라는 도서관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에 책의 등록번호를 입력해 검색하면 대출이력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가 책을 빌려가고 반납했는지 알 수 있다. 전산을 살펴보니, 그 낙서가 방금 반납한 이용자의 대출기한에 들어갔다.
이 일을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반납한 이용자가 자료실 책상에 앉아 독서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서 이용자에게 모르는 척 물어볼까, 괜히 물어봤다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어떡할까. 이러한 흐름이 내 뇌를 스쳐 지나갔다. 일단, 옆 직원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대출이력과 낙서를 보여주며 상황 설명을 다 한 후, 이렇게 말했다.
“이용자한테 낙서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라고 하겠죠?”
“웃으면서 물어보세요. 근데 아마 안 했다고 할 거예요.”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한다.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과형, 내가 언제 그랬냐며 소리치는 적반하장형, 난 모르는 일이다는 식의 나 몰라라 형이 있다. 이 이용자가 어떤 형일지 모르지만, 도서관 직원으로서 책을 깨끗이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용자가 낙서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좋게 질문하기로 결정했다. 전공 책을 펼친 채로 반납한 이용자가 앉아 있는 곳에 가서 날짜를 가리키며 물어봤다.
“이용자님, 혹시 대출하시기 전부터 써져 있었나요?”
그랬더니 성을 냈다.
“내가? 무슨 소리야!” 갈색 안경렌즈 뒤의 눈동자가 커지며 덩달아 소리도 커졌다.
적반하장형이었다. 목소리가 커서 자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목이 집중되니, 다른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을 방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얼른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내 자리로 향했다. 내 자리로 돌아올 때, 괜히 물어본 것 같다는 생각도 몽글몽글 올라왔다. ‘물어보지 말고 연필 낙서였으니까 내가 알아서 지울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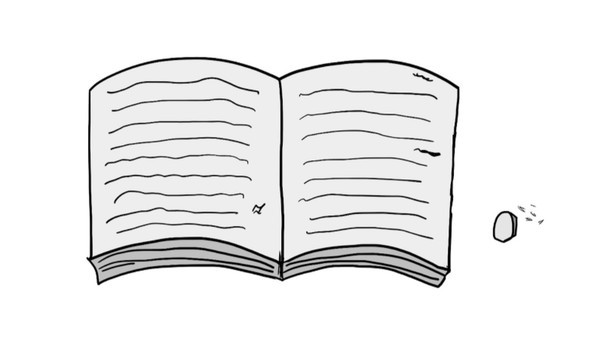
점점 내 머리는 무거워졌다. 그래서 머리를 좀 식힐 겸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손을 씻고 오자고 마음먹었다. 찬 수돗물은 내 손가락을 붉게 만들었다. ‘으, 차가.’라는 감촉이 무거운 생각을 밀어냈다. 가벼워진 머리로 자료실로 걸어갔다. 자료실 문이 점차 가까워지자 내 속은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웬걸, 성내던 이용자가 데스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자료실 문은 유리문이라서 근무하는 데스크가 자료실 밖에서도 보인다. ‘나한테 성을 낼 것이 더 남아 있는 건가, 도대체 왜 내 자리 앞에 서 있는 거지.’
자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옆 직원이 이용자가 나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용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니, 이용자는 “그 전공 책 잠깐 줘보세요.”라는 말을 했다. 아까처럼 화를 내는 것이 아닌 평상시 톤의 목소리였다. 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이다. 전공 책을 드렸더니 몇 장을 넘기며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날짜가 적혀있는 페이지가 나왔는데, 전공 책을 데스크에 놓더니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내 속으로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라는 물음표가 생겼다. 지우개를 건네주었더니, 본인이 날짜를 지우기 시작했다. 분명 3분 전에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다. 어이가 없었다. 진작 인정하시지라고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으니 속으로만 말했다. 이용자는 여기저기 책장을 넘기며 밑줄도 몇 군데 지웠다. 물론 모든 밑줄과 날짜를 지운 것은 아니었다.
이용자가 자신이 만족할 만큼 지웠는지, 책과 지우개를 나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 이때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나, 이렇게 낙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어떡하나, 난처하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우개로 지우며 본인의 잘못임을 보여주고는 말로는 지적했다며 툴툴거리는 모습이라니. 그 말을 했을 때 표정이 압권이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 없고, 마치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꼰대 같은 표정. 이용자가 자료실을 떠나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전공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밑줄과 날짜를 지우개로 지우기 시작했다. 지울 때마다 나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지천명을 넘긴 것이 맞는 건지.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다시금 잘못에는 빠른 인정과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음속으로는 새로운 다짐도 하였다. ‘저렇게 나이 먹지 말자.’
글 | 백승아(아티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