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교수의 ‘살며 생각하며’
자신의 의지나 희망대로 삶이 살아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을 결코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이 주인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내가 태어날 시간과 공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임의의 어떤 시공간에 태어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내야 할 우리가 속한 시대는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고도 남는다. 그로 인해 시대가 운명이 되고 그 운명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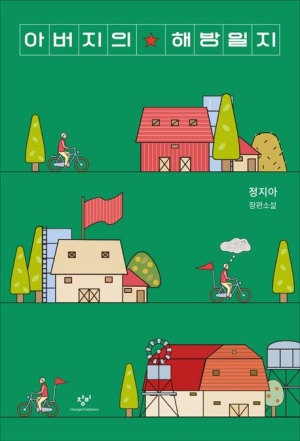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알 수 없는 세월의 격랑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빨치산 아버지에 대한 회고의 이야기이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무수한 죽음을 목도했다. 보급투쟁을 마치고 아지트로 돌아왔더니 동지들의 시신이 목 잘린 채 사방에 나뒹굴고 있었다고, 아버지는 예의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시선으로 덤덤하게 말했다. 밀란 쿤데라는 불멸을 꿈꾸는 것이 예술의 숙명이라고 했지만 내 아버지에게는 소멸을 담담하게 긍정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었고, 개인의 불멸이 아닌 역사의 진보가 소멸에 맞설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무기였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그 험한 시대를 버티고 살아냈건만, 해방이 되자 또 다른 시대의 아픔인 한국 전쟁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었던 시대였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수많은 목숨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그것도 자신과 삶을 같이 했던 가까웠던 사람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죽음이 너무나 흔해 빠져서 그 누가 죽어 나가더라도 더 이상 흐를 눈물마저 말라버려, 그저 담담히 그 사람들을 보내야만 했었다.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다. 그저 빨갱이 아버지 때문에 집안 망하고 공부 못한 것이 한이라 사사건건 아버지를 원망하는 줄로만 알았다. 아홉 살 작은아버지는 잘난 형 자랑을 했을 뿐이다. 그 자랑이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갈 줄 어찌 알았겠는가. 작은아버지는 평생 빨갱이 아버지가 아니라 자랑이었던 아홉 살 시절의 형을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술이 취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었던 작은아버지의 인생이, 오직 아버지에게만 향했던 그의 분노가, 처음으로 애처로웠다.”
아무 생각 없이 형을 자랑하고 싶었던 동생의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목숨이 사라져버렸다.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게 하고 만 것은 운명치고도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그 치 떨리는 삶의 한 조각이 어느 누구의 평생의 삶을 헤어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만 것이었다.
“어머니의 옛 시동생 가족들이 아버지의 영정을 향해 절을 올리는 모습을 나는 어쩐지 처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저들에게 내 아버지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형수를 빼앗아 간 사람만은 아닐 터였다. 형의 친구이고 동지였으며, 운명이 조금만 달랐다면 형과 친구의 처지가 뒤바뀔 수도 있었다. 어쩌면 이건 어디에나 있을 우리네 아픈 현대사의 비극적 한 장면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대단한 것도, 그렇다고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저 현대사의 비극이 어느 지점을 비틀어, 뒤엉킨 사람들의 인연이 총출동한 흔하디흔한 자리일 뿐이다.”
시대의 비틀림이 사람들의 인연과 관계마저 완전히 혼돈 속으로 빠뜨렸고, 세월이 지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삶의 일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며 내가 그 사람의 처지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이제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모습이 되어 버렸다.
“아버지의 유골을 손에 쥔 채 나는 울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상한 인연 둘이 말없이 내 곁을 지켰다. 그들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져 나를 감쌌다. 오래 손에 쥐고 있었던 탓인지 유골이 차츰 따스해졌다. 그게 나의 아버지, 빨치산이 아닌, 빨갱이도 아닌, 나의 아버지.”
시대가 어떻든, 운명이 어떻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너무나 무거운 시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건, 그 선택과는 무관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관계, 아마 그 관계는 어쩌면 시대보다도 더 커다랗고, 어떤 운명이건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것인지도 모른다.
글 | 정태성(한신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