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인
이발소 사내 이야기 / 김성훈
그 많던 머리카락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오늘도 이발사 사내는 고민이 많다. 나를 만나면,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숱 적은 내 머리를 만나는 날이면 그는 사색가가 되는 것이다. 야성의 본능에 달떠 야물게 벼려진 금속성의 흰 이빨을 드러내는 가위를 토닥토닥 달래며 오늘도 이발사는 궁리를 한다. ‘세상에나 이 머리를 어떻게 한다지….’
고뇌하는 우리 동네 이발사를 위해 나는 한 편의 시를 쓰기로 한다. 정말이지 그이가 없었다면 내 머리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지. 가위의 획일적 규율과 폭력적 전횡을 막아 준 이발사 사내에게 이 글을 바친다.
이발소에서 나는 그의
손톱의 반달 같은 하현을 지나
반달의 손톱 같은 그믐도 지나
내 머리에도 달 없는 삭일의 저녁이 찾아오면
나도 어느새 달 잃은 달처럼 어두워져서
공주인지 부여인지에서 왔다는 이발사 사내는
고란사 대웅전 바람벽의 흰 소 같이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아예 입도 없이
커다란 두 눈만이 연못처럼 고여 있어
그를 만나고 온 날이면
내 머리에 부처님 몇 분이 피어날 것도 같고
나의 머리카락도 못 속에서 안거安居하는 연꽃 같은데
깃도 섶도 없는 배내옷 같은 보자기를 두른 나는
달처럼 나의 뒷머리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성글고 새들한 나의 머리를 오래 근심하는 이발사만 보여
나도 또한 나를 근심하면서
나처럼 성성한 그를 미안해하는데
파리하고 물기 없는 등불 아래서
그이는 이슥히 나를 궁리하다가
이윽고 화두 하나 건져내듯 가위를 들고
내 머리를 솎아 내고 가지를 쳐내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에게는
봄이 되어도 더 자래울 꽃도 열매도 없을 것임을 알고
보람 없을 가위질에 송구한 마음만 드는데 문득
어쩌면 내 머리에도 이랑이랑마다
생명 하나 인연의 그물에 걸릴 것이라는
애틋한 소망 하나 생겨나는데
고란사 대웅전 흰 소 같은 그이와
거울 속 연꽃 같은 미소를 나눈 뒤인 것이다
늙은 가죽 위에서
세월에 시달린 면도날이 생명을 얻듯
낡고 오래된 그이의 손에서 나는
배내옷을 입고 한없이 재재거리는 아이마냥 그지없이 행복해 지는데
그 순간 나는 그의
꽃도 열매도 그리고 그 무엇도 다 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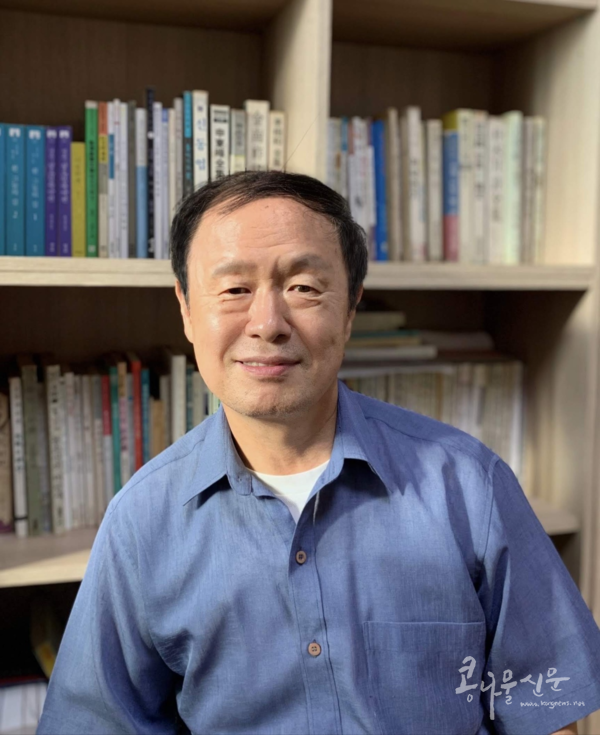
김성훈 프로필
제17회 부천신인문학상 시부문 수상
제18회 부천신인문학상 수필부문 수상
동시집 『지금 뭐 해?』, 공저집 『스물』
Email : 0725ks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