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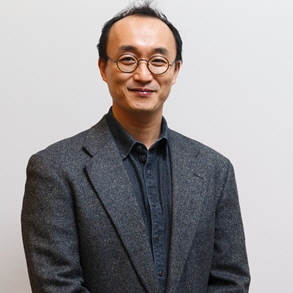
‘가계부채 1,000조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식상할 정도다. 이 어마어마한 빚의 탑이 세워진 것이 작년 연말이고 반복적으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며 조마조마 했지만, 막상 별 일없는 시간들이 흐른다. 모든 동물이 그렇듯이 사람도 지속되는 위기에 쉽게 적응하며 이상상태를 일상상태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매월 통장에서 이자로 빠져가는 삶이 지속된다는 것은 분명히 족쇄에 채워진 삶이고 굳이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은행에서 퇴짜를 맞고 2금융권, 3금융권의 돈을 빌려 막대한 고리대를 물어야 되는 처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그렇다. 당장은 고리대의 부도덕에 분노를 보이지만 금세 “그러게 누가 빚을 내라고 했어?”라는 질문에, “어찌되었든 빚을 얻었으면 갚아야지"라는 태도가 함께 나타난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700쪽이나 되는 방대한 저작 <부채, 그 첫 5,000년>(부글북스, 2011)을 쓰도록 이끈 질문도 이와 같았다. 저자는 제3세계 국가들이 IMF 등 국제기구에 진 빚 탓에 허덕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제3세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나름 ‘진보적인 활동가'의 말을 인용한다.
“하지만 그 국가들은 돈을 빌렸잖아요!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 빚을 갚는 행위가 당연한 행위일까. 그레이버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빚을 진다는 행위는 교환행위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아담 스미스 이래도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환과정은 빵과 물고기를 등가로 바꾸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당장 우리의 전통적인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교환 대상이 생산되는 시기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불일치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테면, 지금 빵을 몇 개 주면 나중에 물고기를 잡아서 줄께라는 빚짐의 관계가 더 상식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빚짐은 구태여 약속했던 물고기가 아니어도 사소한 친절이나 혹은 다른 도움을 통해서 충분히 상쇄되어 왔다.
하지만 국가가 화폐를 찍어내고, 은행을 설립하고 무엇보다 빚을 갚도록 강제하는 법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빚은 윤리적 문제가 되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빚은 실제 유통되는 화폐보다 더 많은 통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만큼 경제가 성장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과정을 보면, 그 빚짐의 관계는 오로지 ‘빚을 내도록 하고, 또 그 빚을 갚도록 하는' 폭력관계에 불과하다. 그레이버가 지적하는 빚의 속성은 바로 이것이다. 빚을 갚지 않으면 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페르시아에서는 빚을 진 지 7년이 지나면 왕의 명령으로 기존의 부채를 청산하는 ‘깨끗한 서판'이라는 절차가 있었다. 그러고도 많은 국가들이 경제를 유지해왔다. 문제는 빚을 대대손손 책임져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인 것처럼 만드는 자본주의 경제와 이를 보증하는 국가의 제도다.
그래서 아예 대안으로 빚짐이라는 상태를 적극적으로 바꾸자는 사람도 있다. 리차드 디인스트가 쓴 <빚의 마법>(갈무리, 2015)은 빚 혹은 빚짐이라는 말의 긍정적인 측면을 끄집어 내고자 한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빚의 상태는 늘 관계를 통해 만들어졌다. 즉, 빚을 짐으로서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서 친밀함이 발생하는 것이다. 디인스트는 그것이 빚짐의 상태가 만드는 연대의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즉, 아예 빚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빚짐의 상태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회적 연대성을 보여주는 징표로 삼자는 것이다. 다소 황당하고 뜬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마이크로 크레딧이나 지역 화폐의 실험들을 떠올리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올 것이다. 은행-국가를 통해서 ‘죄'가 되어버린 빚짐의 상태를 공존을 위한 ‘연대'의 관계로 바꾸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자유로움을 옥죄는 빚은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대상일 뿐이다.

성남시가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장기채무자의 짐을 덜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를테면 100만원짜리 빚을 1만원에 사서 이를 소각함으로서 채무관계를 없앤 것인데, 이런 사실은 우리를 꼼짝 달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빚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을 없는 셈' 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감춰진 진실을 보여준다. 100만원짜리를 1만원에 사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태워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면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성남시의 채무프로그램을 함께했던 제윤경이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책담, 2015)에서 말하는 질문, “왜 모든 빚은 갚아야만 하는가?”를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이다.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