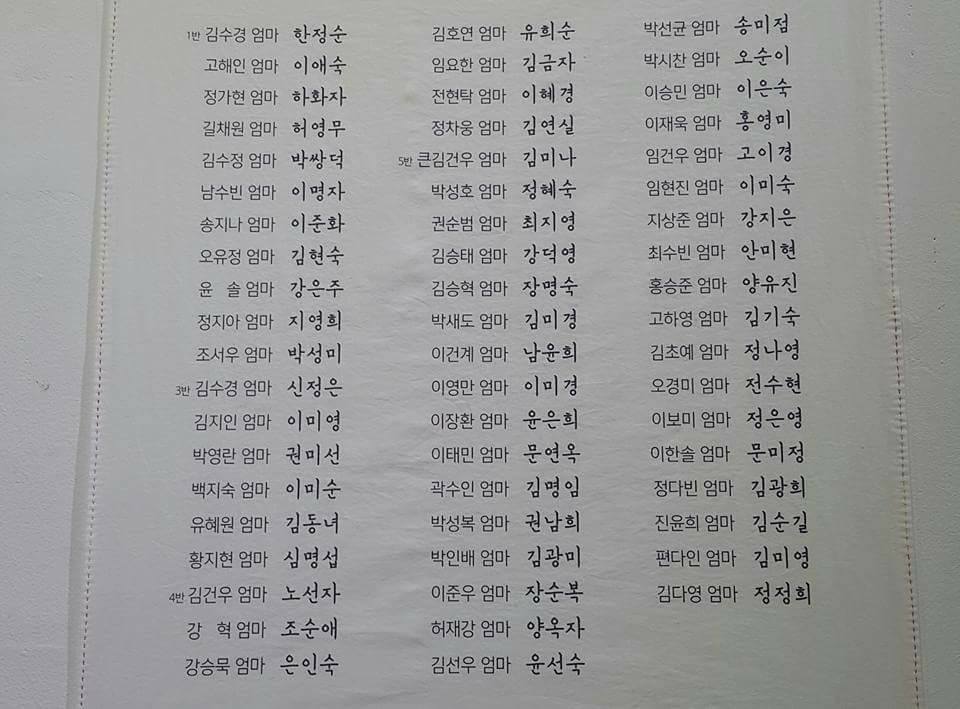세월호 엄마들의 뜨개전시를 다녀와서...
그리움을 만지다
세월호 엄마들의 뜨개전시를 다녀와서...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열린 세월호 엄마들의 뜨개전시에 다녀왔다. 시청역과 연결된 커다란 공간이 시민청이라는 것도 어제 비로소 알았다.
세월호 사고가 나고서는 일상을 사는 게 편치 않았다. 여전히 바쁘게, 또한 즐거운 일이 생기면 웃으며 일상을 변함없이 이어갔지만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속에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그러다 안산에 <치유공간 이웃>이 생긴 것을 알았다. 정혜신 선생님과 이명수 선생님이 안산으로 아예 이주하여 그 공간을 만들었다고 했다. 아이를 잃은 엄마들이 아무 때나 찾아가서 울기도 하고 치유와 치료를 일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감이 들던지.
그 엄마들에게 매일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 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참으로 감동을 받았다. 그렇구나,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어야 하는구나, 그래야 그 엄마들이 살 수 있는 거구나, 싶었다. 생각도 못 하고 생각이 났다 해도 엄두가 안 날 일을 <치유공간 이웃>에서는 하고 있었다.
그리고 들은 뜨개질 이야기. 세월호 엄마들이 치유 공간에 모여서 함께 뜨개질을 한다는 것. 시간이 가지 않는 그들의 시간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뜨개질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그 단순한 일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상처가 치유 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그 엄마들의 뜨개질 전시회가 열린다기에 다녀왔다. 가지 않으면 안 될 자리 같았다. 촛불집회에 나가야 하듯이, 처음에는 무작정 뜨다가 고마운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에게 주고싶은 마음으로 떴다고 한다.
그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은 잠수사들이었다. 캄캄한 바다 속에 있는 배 안을 더듬어 내 아이를 찾아내고 가슴에 꼭 끌어안아 데려다 준 잠수사들에게 엄마들이 갖는 고마움은 컸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다.
번호로 불린 내 아이를 데려다 준 그 잠수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에게 줄 목도리를, 옷을 떴다고 한다. 뜨개질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자기는 머리에 꽃을 꽂고 거리를 돌아다녔을 거라고 어느 엄마는 영상에서 말했다. 그 엄마는 진짜라고 계속 말했다.
나는 어제 세월호 엄마를 처음으로 마주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계광장 시위에서도, 촛불집회에서도 여러 번 보았지만 손을 맞잡아 보기는 처음이었다. 정혜신 선생님이, "별을 보면서 별 기운을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나를 소개하니까, 그 엄마는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그의 웃는 얼굴은 내게 위로가 되었다.
촛불집회 때, 처음으로 청와대 가까이 있는 청운동 주민센타까지 길이 열리던 날 남편과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갑자기 사람들로 가득 찼던 길 한복판이 열리며 누군가에게 길을 터주고 있었다. 남편이 세월호 엄마들이야, 했다. 깃발을 들고 온 그들을 보았을 때의 울컥함. 내게 그들은 늘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기만 한 존재였다.
엄마의 그 웃는 모습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천천히 둘러보고 <기도하는 마루>에 앉아 뜨개질 하는 수녀님께 허락 받고 사진을 찍으면서 인사를 나눴다. 알고 보니 생전에 사제가 되기로 서원했던 고 박성호 군의 이모였다.
전시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조금씩 떠서 기다랗게 된 목도리를 나도 이어서 떴다. 전시가 끝나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 목도리를 만들어 <치유공간 이웃>과 함께 한 고마운 분들에게 나눠줄 거라고 했다. 이명수, 정혜신 두 분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을 직접 할 수 있어서 또 고마운 시간이었다.